[리뷰] 완벽한 세계를 해방하는 균열들
- - 짧은주소 : https://advocacy.jesuit.kr/bbs/?t=gl
본문

ⓒ⟪Small Things Like These⟫ 스틸컷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AI 일러스트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오랜 침묵의 틈 사이로 스며든 균열에 관한 이야기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영화에서 세계는 더없이 견고하고 완벽해 보인다. 1980년대 아일랜드, 가톨릭교회의 권위는 여전히 성스러운 질서의 이름으로 삶의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다. 수녀원은 공동체의 중심이자, 주인공 빌을 비롯한 많은 마을 사람들의 주거래처였으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운영하는 권위의 상징으로 사람들은 이 익숙한 질서에 순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수녀원이 돌봄의 명목으로 착취하는 미혼모들은 감춰져야 할 존재로, 속죄해야 할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침묵 속에 머물러야 했다.
침묵과 질서의 풍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미혼모의 아들로 자라 이제는 다섯 딸의 아버지가 된 빌의 마음에 생긴 사소한 의심 때문이다. 수녀원에 석탄을 배달하며 마주한 차가운 복도와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모른 척 지나칠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된다. 그의 마음에 생겨난 균열은 엄숙한 침묵의 질서 속에서 고통받아 온 이들의 흔적에서, 억압당한 이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 세상에는 때로는 모른 척 넘겨야 할 일도 있다는 친구의 말에도, 그애들은 우리 딸이 아니라는, 우리 딸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아내의 애원에도 빌은 자신의 마음에 생긴 균열을 외면하지 않는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 속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미혼모와 고아 소녀들을 수치와 침묵 속에 가두고 강제노동으로 착취와 학대를 일삼던 ‘막달레나 수녀원(Magdalene Laundries)’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 1980년대 아일랜드에서 가톨릭교회는 여전히 국가와 사회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아일랜드 사회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 특히 교회가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갖기 시작했던 전환의 시점이기도 했다. 빌의 마음에서 생겨난 작은 균열들은 당대 아일랜드 사회가 경험했던, 감시 없이 존속되었던 성스러운 권위에 관한 균열과도 교차한다.
그렇게 은폐된 고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이들의 질문에서 돌봄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억압을 향한 의심이 생겨났고, 진실은 서서히 드러났다. 영화는 막달레나 수녀원이 운영했던 미혼모 보호소에서 자행된 구조적 학대와 침묵의 문화를 서늘한 시선으로 포착한다. 동시에 영화는 엄숙하고 무거운 제도의 벽은 너무나 견고해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가장 사소하고 연약한 것들임을 따뜻하게 증언한다.
미혼모들은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아이들은 국가와 교회의 이름으로 분리되었으며, 그 모든 폭력은 구원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던 시절. 추위에 떠는 여자아이의 몸, 원하는 선물을 받지 못해 슬펐던 어린 시절의 기억, 꾹 눌러 삼킨 그때그때의 말과 눈빛 같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침묵의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폭력에 봉사해왔는지 돌아보게 한다. 자비와 회복을 말하던 공간이 가장 약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가혹한 공간이었다는 슬픈 진실은 교회가 오랫동안 여성의 몸과 성을 통제하려는 기득권의 논리에 기대어 도덕적 권위와 이익을 챙겨온 현실 역시 고발한다.
그러나 영화는 잔혹하고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영화 속 공고한 침묵의 세계를 흔든 것은 다름 아닌 타인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마음이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고,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긴 것을 차마 모른 체 할 수 없던 사람, 아무도 묻지 않던 것을 물은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이름을 떠올린 사람,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이야기에 귀 기울인 사람.
그렇게 외면할 수 없었던 이처럼 사소한 균열들은 오랜 시절 억압으로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과는 달리 인간을 다시 인간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틈이 되어 벽을 허물고, ‘우리’를 확장하며 세계를 더 풍요롭게 해왔다. 영화가 건네오는 균열과 틈에 관한 성찰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더 많은 균열에 우리 자신을 열어두며 끊임없이 흔들리는 교회가 아닐까?
영화의 시선은 소녀들을 억압하는 수녀들이나 통제적인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사소한 균열을 통해 피어나는 용기에 주목한다. 죄책감이 아닌 책임감, 분노가 아닌 연대, 처벌이 아닌 회복의 가능성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진정 숭고하다. 빌의 용기는, 교회가 신앙과 윤리를 앞세워 미혼모를 처벌하고 가장 약한 이들을 억압해 온 모순을 고발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끝끝내 믿음과 희망의 이야기로 만들어 낸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 <콘클라베> 역시 가장 거룩한 것의 모순을 고발한다. 그러나 동시에,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그로 인해 더 단단해지는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한다. 두 영화는 공통적으로 믿음이란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아니라, 균열을 통해 틈을 내고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는 여정임을 증언한다.
정다빈 멜라니아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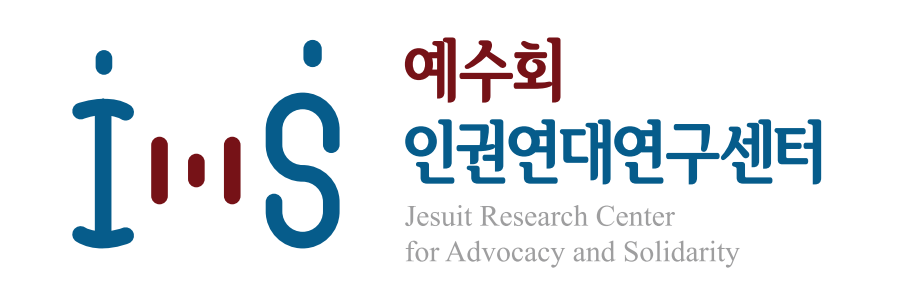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