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난민]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저출산의 정치적 측면
- - 짧은주소 : https://advocacy.jesuit.kr/bbs/?t=ge
본문

저출산에 대응하는 두 가지 모델
지난해 5월 BBC에 “곤두박질치는 출산율에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존티 블룸이라는 재밌는 이름의 기자는 유럽의 경제 관련 전문가로 이 기사는 인구학적 주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즉 순수 인구학적 관점은 아니고 경제적 측면에 치우친 기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그래도 유럽 국가들을 괴롭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들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흥미로운 사실을 제공해 준다.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출산율은 2022년 1.49로 떨어진 상태이다.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 2.1의 출산율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재앙에 가깝다. 2024년 0.75라는 망조가 든 한국의 출산율에 비해서 준수해 보이지만 이 수치는 여전히 사회의 지속이 불가능한 수치이다. 그럼 이렇게 저출산에 시달리는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존티의 분석에 따르면 두 개의 모델이 있다.
첫째는 싱가포르 모델이다. 한국과 일본이 예의주시하고 일부는 준용하고 있는 싱가포르 모델의 핵심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다. 출산에 따른 출산장려금과 주거장려금, 교육비 보조금 등의 패키지는 이미 우리도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 더하여 존티는 싱가포르 모델에서 고용연장이라는 요소를 추가한다. 노혼(老昏)과 노산(老産)은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매한가지이고, 이렇게 늦깎이 부부는 정년에 따른 부담감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이다. 즉 딩크족이라는 요상한 개념의 가정 형태가 등장한 것이다. 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63세의 정년을 2026년 64세로, 2030년에는 65세로, 차후에는 70세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상당히 교활한 이 제도는 저출산 대책이면서 생산력의 유지라는 이중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하지만 싱가포르 모델은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BBC의 기사와 별개로 싱가포르의 연간 출산율 추이를 보면 2022년까지 그나마 1.1을 맴돌던 출산율이 2023년 드디어 0.97로 떨어졌고 지금까지 1.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싱가포르 모델을 따랐던 한국 역시 출산율은 재앙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지고 있다.
조티가 제시하는 두 번째 모델은 이민국가 모델이다. 이민국가 모델은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캐나다와 스웨덴, 영국이 채택한 모델이다. 사실 조티와 그가 인용한 일부 인구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상당히 위험한 모델이기도 하다. 실제로 스웨덴과 영국, 캐나다의 이민국가화 정책은 중지된 상태이다. 조티는 단순히 이러한 종류의 대규모 이민정책은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에 해당된다고 하며 넘어가고 있지만 현실은 좀 더 암울하다. 캐나다의 경우 트뤼도 정권 시기 대규모 이민정책을 시행했다가 대도시의 임대료가 급상승하고 무엇보다 모범적인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이민국가의 그림자
스웨덴 역시 처참하다. 2023년 11월 가디언은 “어떻게 갱들의 폭력이 스웨덴을 휩쓸게 되었는가”라는 기사에서 스웨덴의 총기사망률이 알바니아에 이어 유럽 2위이며 그 밑에는 보스니아, 몰도바와 같은 나라들이 있다고 전하며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 즉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부르는 경제공황-의 여파로 실업률이 폭증했는데, 그 피해의 상당수는 난민 2세들이 입고 있다. 2013년 스웨덴이 대규모의 난민을 받아들인 이후 난민 2세들은 지금 15-20세의 연령대가 되었지만, 이들은 주류사회의 편입되지 못했고 각종 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이 가디언의 설명이다. 바로 그 이유로 스웨덴의 갱 범죄, 특히 히트맨의 연령대는 충격적일 정도로 낮다. 기성 갱들이 난민 2세 청소년들을 히트맨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BBC의 재밌는 이름의 프리랜서 존티 블룸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하는 두 가지 방안은 모두 신통치 않아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 즉 이민국가로의 전환에는 중대한 결점이 있다. 이민국가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한 국가의 국민됨을 어떻게 정의내려야 하는가라는 고도로 정치적인 질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민국가로의 전환은 사회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려 사회의 갈등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유럽 국가를 휩쓸고 있는 강경 우파(hard right)의 정치적 강령이 반이민과 출신지주의-nativism, 즉 이주가 아닌,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국가의 정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즉 유럽과 아메리카의 우경화의 원인에는 컨센서스 없는 이민사회로의 전환이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어디로 가는가?
지난 1월 9일 경북 영양군은 기자 간담회에서 최초의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이전에도 상당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시행되었다.-으로 UNHCR을 통해서 미얀마 난민 40가구를 정착시킬 계획을 밝혔다. 당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이 계획은 요즘 갑자기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다. 영양군의 계획은 존티 블룸이 BBC에서 이야기한 이민국가 모델의 축소판이다. 이민을 통해 농업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험, 무엇보다 생산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화두, 고용허가제로 표상되는 이주 없는 이주노동과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은 결국 이민사회로의 전환뿐이라는 입장 사이의 긴장, 점차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이민 정서, 이 모든 것은 이주라는 주제에 관해 우리는 이제 그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한국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를 정의하는 본질적인 질문이다. 이는 곧 국가와 국민의 정의와 관련된다. 이주정책은 바로 이 본질적인 질문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민국가 담론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준비가 없다면, 이민국가로의 전환은 역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이민은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사회의 유지와 지속이라는 더 큰 주제 속에서 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우리 사회의 구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문제이다. 기억하자. 컨센서스 없는 이주는 극우적인 정치세력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가장 좋은 토양이 된다. 그리고 극우주의는 반이민정서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인간의 평등, 존엄성, 심지어 민주주의 그 자체-을 향해 칼날을 겨누게 된다. 스웨덴 민주당(Sweden Democrats),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ur Deutschland), 핀인당(Perussuomalaiset)과 같은 극우/강경우파 정당이 이렇게 유럽에서 주도권을 잡았다.
우리의 길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진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김민 신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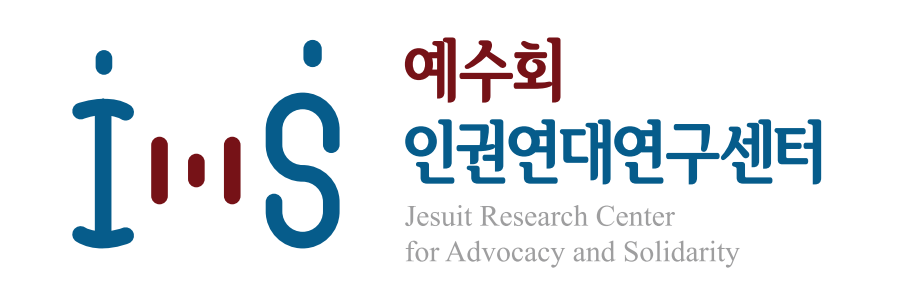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