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사회] 극우의 병리
- - 짧은주소 : https://advocacy.jesuit.kr/bbs/?t=g7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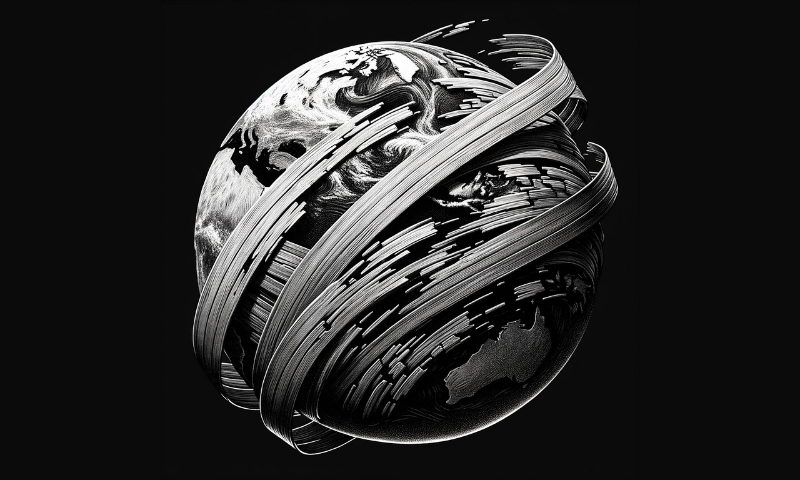
12월 3일 계엄의 밤이 이렇게 길게 이어질지는 몰랐다. 늘어지는 시간만이 아니다. 내란으로 헌법재판을 받는 주동자와 추종자들은 보란 듯이 헌법과 법정을 조롱하고 위협한다. 전례 없는 규모로 탄핵반대 집회에 몰려든 사람들은 증오와 열정이 뒤섞인 얼굴로 기세등등하다. 법원에 난입한 이들의 폭력과 광기에 이르면, 놀라움을 넘어 절망하게 된다. 최근 윤석열 탄핵반대 여론이 30%를 넘는다는 조사가 나왔다(시사인, 2월 14일). 이들이 법과 질서와 전통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보수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이제 극우세력이 사회 전면에 등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게임의 법칙'을 흔들어대는 혼란의 장소가 되었다.
1930년대 유럽은 파시즘으로 민주주의가 붕괴되던 시기였다. 당시 수행된 권위주의 정치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보면, 파시즘은 대중 민주주의와의 급격한 단절이라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병리의 심화로 등장했다고 한다. 이 병리는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며 사회조건에 의해 만들어진다. 무슨 병리인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소비주의의 쾌락으로 전환시켜 살아있는 의식을 무력화시킨다. 단순히 비판적인 의식을 억누르는 데 머물지 않고, 공격성, 허무주의, 분노를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선동한다. 여기에 부응하는 개인들은 쾌락으로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리적 자각이나 지적 판단까지 마비시키며 거침없이 증오와 분노를 드러낸다.
한국은 물론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점점 더 권위주의적인 특징을 지닌 새로운 반(反) 민주주의 정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쌓여온 병리적인 불평등이 만들어 낸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만이 극우세력의 팽창과 직접 맞닿아 있다. 서구의 극우 정치는 이런 토양에 자리 잡고, 국수주의 포퓰리즘, 혐오와 차별, 반이민과 반세계화를 사회적 감수성으로 흡수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달리, 한국의 극우 정치는 반공과 사대주의를 이념으로 삼는 극우 개신교와 정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며, 식민주의에 뿌리를 둔 매국적 성격이 훨씬 더 두드러진다. 게다가 계엄령까지 동원해 정치적 실패를 폭력으로 덮으려 했던 권력의 광기를 보면, 한국의 극우 정치는 전체주의나 파시즘에 훨씬 더 가깝다.
극우 정치의 이념을 사회적 태도로 받아들인 이들은 조작 가능하고 선동적인 미디어와 정치담론에 쉽게 흡수된다. 즉물적인 만족감과 공격적인 자기과시에 빠져들고, 사회적 유대의 단절로 생긴 소외감은 상처로 남아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즉, 이들은 반동적(反動的)이다. 보수적인 의미에서라도 정치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자체를 거부한다. 그래서 이들은 '원한의 정서'로 가득 차, 방향 없는 복수를 꿈꾼다. 니체의 말로는 '축제와 같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그냥 절망이 아니라, 파괴를 기꺼이 즐기는 적극적인 허무주의이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정책을 지지하고 기후 변화를 부정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박해하고 반민주적인 권력에 환호하며, 무능하고 불안정한 지도자에게 권력을 맡긴다. 그 지도자의 행태가 기이할수록 더 열광하며 숭배한다. 기존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변화가 이들에게는 해방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원한과 분노, 억눌린 피해의식, 상실된 우월감은 극우 포퓰리즘의 핵심적인 에너지다. 사실 이들은 달리 붙잡을 것도 없다.
이제, 공동체의 좋은 삶이 회복되기를 염원하며 하루하루 애태우며 사는 이들에게 절박한 질문들이 남는다.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소통할 것이며, 설득이 무력할 때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까? 종교는 이 단절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원한과 분노의 에너지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재정치화할 전략은 무엇일까? 정치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일상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차피 내란 이후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살아 있는 기억의 깊이 속으로 내려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아직은 어둡지만, 불 환한 회복의 장소는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폐허를 떠나 다시 걸어야 한다.
박상훈 신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댓글목록 0